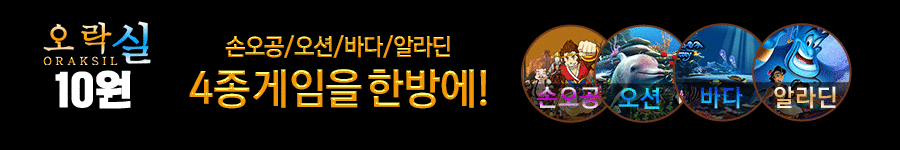(3섬야설) 인도에서 만난 남자 - 13부
작성자 정보
- 밍키넷 작성
- 작성일
본문
"철재 형님. 그리고 명. 움직임을 자제해 주세요. 보트 뒤집힙니다."
"어라? 내 사내다운 풍모에 시비를 거는 거야? 강 중간에서 확 뒤집어 버리는 수가 있어?"
"흠. 물 색깔이 오묘한데 피부병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여기 아가씨들 몸에 내가 약 발라 줄게. 내 침이 즉효 약이거든."
어제의 버닝가트에서 늘어서 있는 많은 나무배들의 하나를 골라 흥정하던 케이가
유난히 덩치가 큰 철재 형님과 명구에게 케이가 장난스럽게 주의를 시키며 싱글거린다.
좌중이 낄낄대며 웃는다.
철재형은 주위의 분위기에 호응하며 너스레를 떨며 반전을 꾀한다.
처음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진 건지 며칠간 여행하면서 정이 쌓인 건지 이런 아저씨 특유의 능글능글한 농담도 잘도 먹힌다.
마치 어제의 일은 나만의 꿈이었던 양 유쾌한 분위기다.
우리 일행과 보트 주인. 그리고 그의 아들로 보이는 웬 꼬마.
열다섯 명이 둘러앉은 보트는 위태위태하게 물결을 헤치고 나아간다.
저녁때이지만 아직 날이 채 저물지 않아 비스듬히 누인 햇빛에 비친 고풍스럽고 이국적인 건물과
강변에 줄지어 잇대어진 많은 작은 배들 그리고 강변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 마치 베니스의 상인에서 묘사된 운하의 풍경 같다.
"안테나에요."
케이가 뜬금없이 말을 내뱉는다.
인도인의 시적인 화법만큼이나 이 녀석의 화법 또한 독창적이기 이를 데 없다.
그가 한마디 툭 던질 때마다 저 녀석이 또 무슨 소리를 지껄이나 궁금해져 나도 모르게 케이의 페이스에 휘말린다.
케이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 저편을 가리킨다.
자세히 보니 머리를 깎고 있는 풍경이다.
특이하게도 모두 뒷머리에 꽁지 머리만 남기고 빡빡머리다. 아주 인상적이다.
올해 인도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인가?
"종교적인 거죠. 죽어 갠지스강에 빠지면 시바가 저 꽁지머리를 잡고 끌어 올린대요. 뭐 접신을 위한 안테나인 셈이죠."
내 옆엔 은혜가 앉아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가까이 앉다 보니 또 은혜 주위로 오게 되었다.
오늘 은혜는 유난히 말이 없다.
은혜는 조용히 주위를 구경하며 어디 마음에 드는 풍경이 나오면 디카를 한 번씩 들이대고 한 번씩 케이를 쳐다본다. 왠지 은혜의 안색이 창백해 보인다.
"너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은혜에게 슬며시 말을 걸어본다. 은혜는 대답하지 않는다.
역시나 이 녀석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속이 쓰려온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내 마음이 갠지스강물의 빛깔만큼이나 흐려진다.
"저기 **** 호텔이에요."
한참을 조용히 있다 은혜가 목소리를 낸다.
은혜가 다시 말을 걸어주는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꾸한다.
"***** 호텔? 거기가 왜?"
"류시화 씨가 묵었던 호텔이래요."
"아!"
또다시 둘만의 침묵이 시작된다.
주위 사람들이 도란도란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지만 마치 처음 듣는 언어인 양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다.
나도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한번 읽어 볼 걸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 나 무식하다.
"저게 뭐야? 저거?"
반항기 처자들의 놀란 목소리에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강 물 위로 제법 큰 덩어리가 둥실 떠 있다.
"설마 시체는 아니겠지?"
누군가 떨리는 음성으로 자기 생각을 말한다.
"확인해 볼까요? 흠. 자세히 보니 저기 약간 튀어나온 것이 사람의 코 같기도 하고."
케이가 싱글거리며 짓궂게 반항기 처자들을 놀린다.
반항기 처자들은 정색한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가자고 케이를 재촉한다.
해가 저물어 간다.
강 저편으로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밀려온다.
주변이 어두워지자 나의 후각은 더욱 예민해져 옆에 앉은 은혜의 체향을 흠씬 느끼고 있다.
이 녀석은 인간 방향제가 틀림없어.
배가 어딘지 모를 가트로 가고 있다. 가트 변에는 모종의 종교의식이 펼쳐지고 있다.
무대가 설치되어져 있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음악과 촛불을 든 남자들이 그 음악에 맞춰 천천히 율동을 하고 있다. 왠지 신비스러운 분위기다.
배가 천천히 강변으로 가자. 이미 관광객들을 실은 많은 배들이 정지한 채로 늘어서 있고 곧 우리의 배도 그들의 주위로 정박한다.
일행들은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양 사진을 찍는다.
"어? 사진이 계속 흔들리고 흐리네. 케이?"
잠시 인상을 찡그리던 은혜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얼굴을 활짝 펴고 케이에게 다가간다.
"이거 오토매틱으로 맞춰져 있네. 그렇군. 은혜야 여기 흔들리는 건 셔터 속도가 늦어서 그러니까 셔터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조리개를 조금 더.
아슬아슬하게 찍히겠다. 겨드랑이를 붙여. 손목을 고정하고. 호흡은 천천히. 그래그래"
저 녀석 왜 저래? 남자가 싫다고 했으면 초지일관 냉정하게 대해야지. 왜 저렇게 친절한 거야?
그러면 괜히 또 은혜만 상처 받을 건데.
`야. 너무 가깝잖아. 손은 왜 만지는데? 떨어져.`
다른 사람이 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걸. 나만 혼자 괜스레 흥분하고 있다.
이런 내 모습에 짜증이 난다.
한 십 분을 보니 슬슬 지겨워 지려고 하는데 웬 여자아이가 바구니를 들고 우리 배로 건너온다.
그것을 보고 우리 배에 타고 있던 꼬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입구를 가로 막고 서서는 고압적인 태도로 뭐라고 이야길 하더니 케이를 돌아본다.
"저 여자아이는 나중에 강물에 띄울 초로 만든 꽃을 팔러 온 거에요. 개당 5루피라는데 실제 원가는 2루피죠.
뭐 다른 데 가서 알아보면 그렇게도 살 수 있겠지만 저 아이도 나름대로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저러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사 줘도 좋을 거 같아요."
일행들은 케이의 말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초로 만든 꽃을 산다. 이상하게 바가지를 쓰는 걸 알면서도 다들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빌어먹을. 이거 또 케이의 페이스에 말렸군.
"지겹죠? 뭐 별로 볼 것도 없죠. 처음에만 조금 신기할 뿐. 슬슬 꽃이나 띄우러 갈까요?"
배는 천천히 가트에서 강 중앙으로 나아간다.
모터를 끄고 나니 사방이 고요하다. 멀리 보이는 가트에서는 불이 켜진 채 아직도 의식이 진행 중이다.
"우와! 별 좀 봐."
은혜가 놀란 듯 소리를 낸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이 지금이라도 머리 위에 떨어져 내릴 듯 위태위태하게 겨우 하늘에 매달려 있다.
"어머. 번개다"
강 건너편 먼 하늘에 뭉쳐진 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 간간이 번개도 치고 있다.
신기하다. 번개를 이렇게 덤덤하게 구경할 수 있다니.
케이가 라이터를 꺼내 초에 불을 붙이고는 라이터를 돌린다.
초를 실은 작은 연꽃무늬 꽃 배가 하나둘씩 강의 거친 물결에 떠 가기 시작한다.
꽃 배는 점차 멀어지고 은혜는 그것들을 아련한 눈망울로 주시한다.
그녀의 하얗고 긴 목덜미가 처연해 보여 내 마음을 움직인다.
배에 모터가 다시 켜지고 현실로 돌아온다.
"다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케이가 싱글거리며 묻자 한두 명씩 이야기를 시작한다.
부모님의 건강, 직장, 남자친구, 군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비밀이에요"
내 차례가 되자 주위의 야유를 감수하고 비밀이라고 말해 버렸다.
솔직히 막상 소원을 빌려니 그 무엇도 빌지 못했다.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뭐 인도에 오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이쁜이의 행복이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혼란스럽다.
내가 이쁜이의 행복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케이를 사랑하게 되기를 빌었어요."
은혜가 나직하게 이야기한다.
주위에 탄성과 환호성 그리고 야유가 시끄럽게 흘러나온다.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 녀석 알고 있었지만, 너무 솔직하고 당돌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시를 하다니.
"나는 사랑이란 감정을 잊게 해 달라고 빌었어요. 갠지스강에 올 때마다 항상 그 소원을 빌죠."
들뜬 분위기가 단숨에 착 가라앉는다.
케이는 나직하게 그 말을 하더니 담배를 꺼내어 태운다.
은혜도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다.
주머니를 뒤지니 담배가 없어 은혜에게 오 루피를 내민다.
담배 맛이 왠지 굉장히 쓰다.
사람들이 은혜를 동정 어린 혹은 위로하는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케이와 은혜와 나는 말없이 담배만 조용히 태운다.
"짜이 마실래?"
보트에서 내리니 주위에 짜이 장수가 있어 은혜의 팔을 끌고 짜이를 사서 주었다.
"그거 저 강물을 그냥 끓인 겁니다."
케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내뱉는다.
그 말을 들은 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짜이 잔을 나에게 돌려주고는 케이의 뒤를 따라 숙소로 돌아간다.
은혜의 어깨에서는 더 이상 당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제기랄. 케이 이 개자식.